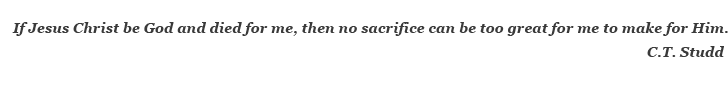지금까지 웩 한국본부는 성인 대상의 선교학교와 센더스쿨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몇몇 지역 교회로부터 어린이 대상의 선교 프로그램이 있냐는 문의를 받았고, 그 이후 많은 기도와 준비 끝에 드디어 2025년 2월에 첫 어린이 선교학교를 열게 되었습니다. 어린이들이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해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선교에 동참하도록 돕는 위키즈는 2박 3일간 우면동교회(담임목사 정준경)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준비를 막 시작할 무렵, 처음부터 끝까지 ‘선교’만 말하는 캠프에 아이들이 잘 참여할까 하는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캠프 준비팀의 여건도 충분치 않아 주저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이들의 옥토 같은 마음을 보게 하셨고, 의심이 사라지자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2박 3일 동안 우리 모두 정말 행복했습니다.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놀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사랑했습니다. 교사들은 온 마음을 퍼부어 아이들을 섬겼고, 아이들은 그것을 마음껏 누렸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꿈을 품은 자들의 천국 잔치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어린이들의 거룩한 열정을 느낄 수 있어 정말 감사했습니다.
캠프 이후 아이들과 선교사 열전 도서를 함께 읽으며 후속 모임(북앤톡)을 이어 오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책 나눔을 이렇게 재미있어 할 줄 미처 몰랐습니다. 웃고 떠들면서도 그 안에 진솔한 나눔이 있어 도전과 은혜가 됩니다. 아이들 입에서 나오는 미전도종족을 향한 기도 소리는 그 어떤 음악보다 아름답습니다. 그 기도가 땅끝까지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은 위키즈 어린이 선교학교에 참석한 선생님과 학생들 중 일부의 소감입니다.


강나영 선생님
이번 위키즈에 참여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온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계신 선교사님들과 함께했습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삶을 배우고, 제 좁은 시각을 모든 민족을 향해 넓힐 수 있었습니다. 또한 참 놀라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된 아이들을 세우셨음을 보았습니다. 2박 3일의 동행에서, 아이들은 각자의 아이다움으로 그 안에 계신 작은 예수님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온몸으로 호흡하며 하나님의 꿈을 들이마시고 자신의 꿈을 내쉬었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한 수많은 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셨음을 믿습니다. 세상 속으로 돌아온 지금도 그 감사와 놀라움의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김은유 학생
(초등 6학년, 1차영입자 자녀) 위키즈 후 저의 생각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위키즈에 가기 전에는 ‘선교’하면 척박한 땅에서 예수님을 전하다 죽는 것이 생각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꿈이며, 하나님은 선교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을 알았고, 이 깨달음은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움직여 주신 덕분입니다.
저는 올해 3월부터 버스를 타고 하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버스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라도 전도하고 싶은데 방법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전도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한 끝에 버스 뒷좌석이라면 어디에나 있는 조금 큰 홈이 보였습니다. 거기에 전도 메시지를 넣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걸 보고 마음이 움직여지는 사람이 딱 한 명이라도 있게 해주세요.” 그 이후로는 저에게 자리를 양보해 주신 분들, 또는 제가 양보해 드린 분들께 버스에서 내리기 직전에 직접 쓴 전도 쪽지를 드립니다. 저는 그분들이 쪽지를 보고 받을 때 마음에 기쁨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하나님! 저의 쪽지를 받은 분들을 천국에서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오늘도 기도하고 선포합니다!
한수연 학생 (초등 4학년, 분당우리교회)
내가 북앤톡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위키즈 수련회에 참석한 것이었다. 북앤톡은 선교사에 대한 책을 읽고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독서클럽 같은 것이다. 첫 번째 시간은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에 대한 책을 읽고 토론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줌(Zoom) 온라인으로 북앤톡에 참여했다. 일단, 친구가 많아서 좋았다. 온라인으로 게임도 하고, 책에 대한 복습 퀴즈도 하였다. 진행은 문답 형식이었다. ‘허드슨 테일러가 ~을 했을 때,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서로 나누었다. 이런 문답식이 친근감이 들고 편안하게 느껴졌고 내가 몰랐던 이야기도 더 알게 되어 좋았다. 그리고 채팅창에 서로 댓글을 달며 이야기를 나누어 더욱 재미있었다. 중간중간 퀴즈나 게임을 통해 점수를 얻을 수 있었는데 그런 것도 재미있었다. 그리고 친구들의 모습, 친구들의 목소리와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좋았다. 또한 허드슨 테일러에 대해 알아보는 것 자체가 재미있었다. 다음에도 이런 방식으로 북앤톡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박하은 학생 (초등 5학년, 우면동교회)
2박 3일 동안 저는 많은 말씀을 듣고, 새로운 찬양과, 게임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한테는 모든 시간이 은혜롭고 재미있었습니다. 특히 선생님들과의 기도시간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처음 경험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생각으로 ‘울어라 맘껏 울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저에게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해주시기를 바랐던 소원이 이루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게 아닐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그것이 가장 큰 은혜였고 행복이었습니다. 펑펑 운 다음 날은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깨끗하게 청소해 준 것처럼 마음이 맑아졌고, 하나님께만 온 마음 다해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역사 속의 수많은 선교사들이 선교의 꿈을 어린 시절에 품었다는 것을 종종 듣습니다. 그것이 책에서만 보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세대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교하는 하나님께서 아이들의 영적 세계를 넓히고 계시고, 아이들은 그 안에서 귀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너무 가슴 뛰는 일입니다.
빛이 드러날 때 어둠은 물러갑니다. 우리 자녀들이 빛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이 땅을 복음으로 밝히는 귀한 등불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어린이 선교학교를 통해 당신의 꿈을 성실히 이뤄가시는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wec
글 박진영
[2026년 위키즈는 2월 5-7일 진행합니다.]